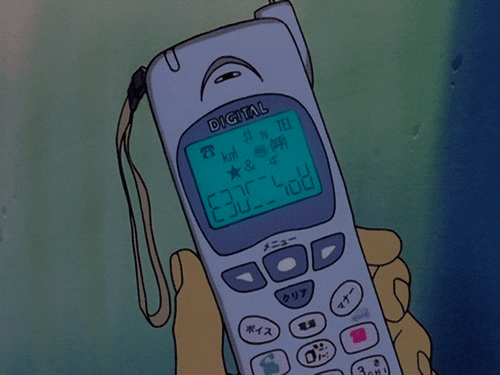사랑니 한 개
2020. 11. 13. 00:14홍중은 아직 제대로 피가 돌지 않는 손가락을 펴 알람을 죄다 밀어 껐다. 깜빡거리는 화면. 6시 반이었다.
삼
이
일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고 나서 일어나는 건 홍중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숫자를 세고, 정자세로 일어나 앉아서 고개를 양 옆으로 두어 번 꺾는다. 평소와 같은 순서로 일어나는 일 사이 이상한 이물감이 끼어드는 건 달갑지 않다. 홍중은 뻣뻣한 혀를 옆으로 꺾어 비어있던 어금니 뒤의 자리를 더듬었다. 물렁하니 잇몸만 느껴져야 할 곳에 정체 모를 것이 봉긋이 솟아있었다. 작고 단단한 그것을 혀로 톡톡 건드리자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다. 계속 속에 있지, 괜히 나와서는 여린 입 안을 헤집는 게, 꼭,
*
"덥다, 그치."
안녕. 도톰한 입술 밖으로 내어지는 목소리가 달았다. 박성화는 생긴 거랑은 달리 김홍중 앞에서 순하게 굴었다. 홍중이 아파트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있던 성화를 일으켜 세우자 힘없이 딸려오는 게 여름은 여름이었다. 열기에 약한 성화는 나풀거리며 무게중심이 홍중 쪽으로 치우쳤다.
"무거워."
성화는 홍중의 묘하게 날 선 말 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예 어깨에 팔까지 얹었다. 온몸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선 모를 애정이 심술궂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꼭 우리 사귀는 거 같아."
"우리?"
초여름 아침, 그리 불쾌하지 않은 끈적거림. 요즘 홍중은 성화가 내뱉는 말들이 갈수록 이상하게 들렸다. 학교와 가까워질수록 물에 젖어가는 솜처럼 어깨 위에 얹힌 팔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적당히 까맣게 탄 팔을 치워내자 성화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통하지도 않을 칭얼거리는 소리를 했다.
"진짜 미치겠네. 힝? 네 얼굴에 그런 효과음이 말이나 되냐?"
"내가 뭘, 내 얼굴이 어떤데?"
"몰라서 물어?"
귀엽기만 한뎅. 동그란 눈을 하고 한껏 볼을 부풀린 성화가 홍중에게 얼굴을 냅다 디밀며 말했다.
"오늘 애들 축구한다는데 같이 뛸 거지?"
"응. 땀날 거 같아서 일부러 반팔티 하나 더 챙겨 왔어."
홍중은 자신을 향해 곧게 뻗은 성화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모로 꺾었다. 급하게 움직여야 했던 고개에서는 순간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났고 성화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홍중의 뒷목을 주물렀다. 길쭉한 손가락과 뭉툭한 손 끝이 조물조물 흰 목선을 제 멋대로 오갈 동안 홍중은 빨리 가자고, 늦겠다고 답잖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8시 10분인데?"
망할 놈의 시계.
홍중의 속도 모르는 성화는 홍중의 발개진 귓바퀴를 엄지로 쓸었다.
덥냐?
덥긴 무슨. 한 개도 안 더워.
홍중은 아무 예고도 없이 지척에 보이는 교문을 향해 내달렸다. 홍중의 그리 커다랗지 않은 등에서 검은색 백팩이 통통 튀었다. 성화는 홍중을 따라잡는 대신 점점 멀어지는 그 복슬한 잿빛 머리를 보면서 홍중의 등에 걸린 가방을 번쩍 들어올려서 홍중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상상을 했다. 홍중의 귀가 발갛고 뜨거웠기 때문에, 성화는 헛소리 같은 상상이라도 해야 했다. 박성화는 이미 김홍중에 반응한 자신을 달래기에 애국가는 별 쓸모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
축구는 싱겁게 무승부로 끝났다. 6교시부터 7교시, 동아리 시간을 꼬박 채워서 달린 아이들은 구령대 위로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가방을 메고 떼를 지어 교문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그 틈에 끼어있었을 홍중과 성화는 조금 느리게 걸어 운동장 가에 있는 급수대로 향했다. 홍중이 위에 걸치고 있던 체육복을 벗는 동안 성화는 먼저 수도꼭지를 열었다.
"세수하면서 그냥 머리까지 대충 씻어버릴까?"
"오바야, 너 염색하고 나서 함부로 머리 안 감잖아. 보색샴푸 없인 비도 안맞겠다며. 나중에 후회하려고?"
"아, 더운데."
"..엎드려 봐."
"뭐?"
"그, 턱에 손 받치고. 응 그렇게. 너 반팔티 가져왔다고 했지?"
뭐하게? 홍중이 의문섞인 눈으로 성화를 돌아보는 순간 성화가 손우물에 가득 담은 물을 홍중의 상체에 부었다. 등줄기로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고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홍중이 급하게 자기 수도꼭지를 열어 손에 물을 담았다. 홍중의 한껏 사악하게 벌어진 입동굴이 호선을 그리고 성화는 곧 자신의 얼굴에 손바닥으로 수압을 세심하게 조정한 물줄기가 뿌려지는 것을 그대로 다 맞았다.
한참 서로에게 자비 없는 공격을 퍼부은 뒤 헛숨을 들이키며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성화는 스텐드 위로 성큼 올라가 앉았다. 모두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학교는 조용했다. 홍중은 성화를 잠시 바라보다 같이 올라가 성화 옆에 걸터앉았다. 해가 떨어지고도 이러고 있으면 추울 텐데. 이제 홍중은 성화에게 무슨 말이라도 꺼낸 다음 집에 가고 싶었다.
야 나 니가 처음에 등에 물 부은 거 땜에 바지까지 젖은 거 같애.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이었다. 평소라면 한참을 웃다 홍중을 놀려먹었을 성화가 이번엔 꽤 오래 대꾸하지 않았다.
진짜 이상해지고 있어.
홍중은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침묵이 길어지자 식었다고 생각했던 몸이 다시 후덥지근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사실 곁에 앉은 성화의 몸이 뜨거웠다. 원인 모를 열기. 홍중은 불안한 눈동자를 굴리며 무의식적으로 어금니 뒤 살짝 솟은 사랑니를 혀로 쓸었다.
꿀꺽. 누구의 목구멍에서 들린 소리인지 모를 것이 지나가고, 성화는 반대편을 보던 고개를 돌려 그대로 홍중의 얼굴에 갖다 박았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입술은 아니었다. 볼과 입술 사이 그냥 살색인 애매한 곳에 뜨끈하고 물렁한 것이 비벼졌다.
"...뭐야?"
"..."
홍중은 갑자기 어금니 뒤, 뭉툭하던 살을 뚫고 사랑니가 자란 부위가 참을 수 없이 간지러운 것을 느꼈다. 어쩌면 마음이 간지러운지도 몰랐다. 심장이 가려웠다. 진짜 짜증 나 죽겠어. 홍중은 성화의 어깨를 양손으로 꾹 쥐고 제 쪽으로 당겼다. 이번엔 진짜 입술 위였다. 포개지고, 뭉개지고, 거칠 거 없이 홍중의 입이 벌어졌다. 성화의 혀가 입 안에 닿을 때마다 머리털이 죄다 뾰족뾰족하게 서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딸려서 입이 떨어지는 찰나면 어금니 뒤가 간지러워 죽을 거 같았다. 성화는 자기도 모르게 옆의 바닥을 짚은 홍중의 손을 제 손에 얽었고 그 손바닥은 무척이나 끈적거렸지만 홍중은 얽힌 손을 풀지 않았다. 홍중은 속으로 이 사랑니가 다 자라고 앞으로 세 개가 더 난다는 가정 하에 성화와 얼마나 더 키스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홍중은 아주 이상한 희열을 느꼈다. 박성화의 이런 이상한 돌발행동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성화가 입술을 떼고 장난하듯 입술 위에 몇 번 더 콕콕 입술을 부딪히자 홍중은 새빨개진 귀를 하곤 성화의 티셔츠를 잡아챘다.
"언제부터야?"
"좀 됐어."
성화는 홍중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일그러진 얼굴. 그 와중에 벌어진 입술을 다시 입에 넣고 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자신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었다.
"내가 너무 못했어?"
"...내가 이게 못한 건지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너 이거 처음 아니냐?"
"넌 처음이야?"
그래 홍중아? 처음이야? 홍중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골이 울렸다. 웃지 마. 홍중은 벌떡 일어나 옆에 벗어두었던 체육복을 성화에게 던졌다. 오늘은 나 먼저 간다. 굳이 또박또박 인사까지 하고 교문으로 달려가는 홍중이 성화의 눈에는 정말 귀엽고 웃기다는 걸 김홍중은 알까. 성화는 홍중의 체육복을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가져온 반팔티는 갈아입지도 못한 채 교문을 나선 홍중의 뒤를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따라 걸었다. 여름은 충분히 기니까.
'SH' 카테고리의 다른 글
| Geek In The Pink (0) | 2021.02.16 |
|---|---|
| 세계는 사랑에 빠져있어 (1) | 2020.08.04 |
| 신 (0) | 2020.07.31 |
| 星 (0) | 2020.06.03 |
| Off-line lover (0) | 2020.06.03 |